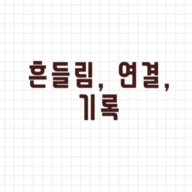-
바이러스는 어떻게 제국의 무기가 되었는가
16세기,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열강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곧 **정복(conquest)**으로 이어졌다.
화려한 황금 문명과 찬란한 피라미드를 가진 아즈텍과 잉카 제국은
겨우 수백 명의 스페인 병사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이 극적인 정복 뒤에는 총과 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바로 **‘천연두(smallpox)’**가 있었다.천연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과 인구 구조,
그리고 이후 수세기에 걸친 제국주의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 변수였다.
1. 신대륙의 ‘면역 없는 땅’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원주민보다 기술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있지 않았다.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로 면역력의 차이다.유럽은 중세를 거치며 흑사병, 홍역, 천연두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그 과정에서 생존한 사람들, 특히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이들은
자연면역 또는 부분면역을 갖게 되었고,
이는 후세로 유전되었다.반면, 아메리카 대륙은 수만 년 동안 유라시아와 생물학적으로 격리된 공간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유럽의 전염병과 전혀 접촉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면역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결국 유럽인은 병을 ‘가지고 간 자’,
원주민은 **병을 ‘처음으로 마주한 자’**가 되었다.
2. 천연두의 전파와 아즈텍 제국의 붕괴
1520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멕시코 고원에 진입해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인 아즈텍 제국과 충돌했다.
당시 아즈텍은 수십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수백 명의 스페인 병사가 이길 가능성은 없었다.’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1년 후 아즈텍은 멸망했다.
그 사이 벌어진 결정적 사건은
천연두의 유입과 대규모 감염이다.스페인군의 아프리카계 노예 중 일부가 감염되어 있었고,
그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아즈텍 수도 테노치티틀란 전역에 퍼졌다.
도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왕족과 사제, 전사들이 병으로 죽거나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스페인은 사실상 전투가 아닌 질병으로 전쟁을 끝낸 셈이었다.

3. 잉카 제국과 ‘무혈입성’
비슷한 일이 남미의 잉카 제국에서도 벌어졌다.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고작 180명과 몇 마리의 말만을 가지고
천만 명 규모의 잉카 제국을 상대했다.
그런데도 1532년, 그는 제국의 수도 쿠스코에 거의 무혈 입성할 수 있었다.이유는 단 하나.
천연두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이다.잉카 황제 와이나 카팍과 그의 후계자는
유럽인과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연두에 감염되어 사망했고,
후계자 다툼과 내전이 일어나는 틈을 타
피사로는 손쉽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이는 유럽이 병원균을 ‘무기화’한 최초의 글로벌 사례 중 하나다.
4. 원주민 인구의 붕괴와 제국주의의 구조
천연두를 비롯한 유럽의 전염병은
한 세대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80~90%를 사라지게 만들었다.이는 단순한 질병의 피해를 넘어
사회구조, 정치체계, 농업생산, 가족제도 자체를 붕괴시켰다.문명은 기록자와 계승자가 있어야 유지되는데,
감염병은 그들 모두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후 수십 년간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제국의 농장 식민지로 전환되며,
본격적인 노예무역과 설탕 플랜테이션 경제가 뿌리내리게 된다.즉, 천연두는 제국주의를 위한 ‘인프라 제거 도구’처럼 작동했다.
저항할 수 있는 정치권력과 군사력, 문화 기반을 무력화시킨 뒤
무력은 물론 경제적 지배까지 가능케 했던 것이다.
5. 바이러스를 무기로 삼은 인간의 선택
단순한 전염병이라면 ‘피해자’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 속 일부 유럽 세력은
천연두를 ‘고의적 전염병’으로 이용했다는 기록도 있다.1763년, 영국군은 북미 오지의 원주민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천연두에 감염된 담요를 원주민에게 건넸다.
이는 인류 최초의 생물학적 전쟁(biological warfare)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된다.이처럼 질병은 때로는 ‘우연한 피해’였지만,
때로는 의도된 지배 전략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잔혹성과 질병의 정치성을 함께 보여준다.
6. 오늘날의 시사점
현대 사회는 전염병과 제국주의라는 과거의 조합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재현하진 않는다.
그러나 감염병이 불평등을 드러내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백신 접근성에서의 선진국-개도국 격차
- 전염병 대응 능력의 국가별 차이
- 감염자를 ‘비문명적’으로 낙인찍는 문화
이러한 현상들은 여전히
질병이 사회구조를 분해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천연두가 제국주의를 도운 것처럼,
현대의 팬데믹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마무리
총과 칼로 이룬 정복은 인류 역사에서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천연두처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이뤄낸 정복은,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이었다.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은
무기보다 바이러스에 의해 먼저 무너졌고,
그 이후 제국은 질병을 기반으로 한 착취의 시스템을 구축했다.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전염병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때때로 인간의 선택과 침묵에 의해
누구의 생존과 소멸을 결정짓는 정치적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세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사 | 아시아 vs 유럽, 전염병 대응 차이 (0) 2025.04.26 세계사 | 전염병과 종교의 변화 – 신의 징벌인가 과학의 출발인가 (0) 2025.04.26 세계사 | 콜레라와 런던 하수도 혁명 (0) 2025.04.25 세계사 | 스페인 독감이 세계 1차 대전에 미친 영향 (0) 2025.04.25 세계사 | 흑사병이 농노 해방을 불렀다고? (0) 2025.04.24
질병이 바꾼 세계사
전염병은 단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무너뜨렸고,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으며, 종교의 방향을 바꾸고, 여성의 삶을 바꿨으며, 인간 사회의 ‘기본값’조차 뒤흔들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전염병이라는 렌즈로 세계사를 다시 읽는 공간’, 《질병이 바꾼 세계사》, 전염학자 가인이 운영합니다.